ņ×ÉņŚ░ņé¼ ļ░Ģļ¼╝Ļ┤ĆĻ│╝ ņŗ£ņ▓Ł ļō▒, ļ╣äņŚöļéśņØś ĒÆŹĻ▓Įļōż
ņ¢┤ļŖÉ ļÅäņŗ£ļéś ĻĘĖ ļÅäņŗ£ņØś ņŚŁņé¼ņÖĆ ņĀäĒåĄņØä ļŗ┤Ļ│Ā ņ׳Ļ▓Āņ¦Ćļ¦ī ņ£Āļ¤ĮņØś ļÅäņŗ£ļōżņØĆ ņ░Ė ĻĘĖļ¤░ Ļ▓āļōżņØ┤ ņל ļ│┤ņĪ┤ ļÉśņ¢┤ņ׳ļŖö Ļ││ņØ┤ļØ╝ļŖö ņāØĻ░üņØ┤ ļōĀļŗż. ļ¬ć ļ░▒ļģä ļÉ£ Ļ▒┤ļ¼╝ļōżņØ┤ Ļ│ĀņŖżļ×ĆĒ׳ ļ│┤ņĪ┤ļÉśņ¢┤ ņ׳ļŖö ļ╣äņŚöļéśļź╝ ļ│┤ļ®┤ ņŗ£ļ®śĒŖĖ ļāäņāłļÅä ņ▒ä Ļ░Ćņŗ£ņ¦Ć ņĢŖņØĆ ņä£ņÜĖņØś ņéŁļ¦ēĒĢ©ņØ┤ ļ¢Āņśżļź┤Ļ│ż ĒĢ£ļŗż. ļŁÉļōĀ ņāłļĪ£ņÜ┤ Ļ▓āņØ┤ ņóŗņØĆ Ļ▓āņØ╝ Ļ▓āļ¦ī Ļ░ÖņĢśļŹś Ēøäņ¦äĻĄŁņØś ņÜĢņŗ¼ņØ┤ ņÜ░ļ”¼ņØś ļÅäņŗ£ļź╝ ļäłļ¼┤ ņéŁļ¦ēĒĢśĻ▓ī ļ¦īļōżņ¢┤ ļ▓äļ”░ Ļ▒┤ ņĢäļŗÉĻ╣ī. ļ¼┤ļČäļ│äĒĢ£ Ļ░£ļ░£ņ£╝ļĪ£ ņé¼ļØ╝ņĀĖļ▓äļ”░ ņ┤łĻ░Ćņ¦æ, ĻĖ░ņÖĆņ¦æļōżņØ┤ Ļ│ĀņŖżļ×ĆĒ׳ ļ│┤ņĪ┤ ļÉśņ¢┤ ņ׳ņŚłļŹöļØ╝ļ®┤ ņÜ░ļ”¼ ļéśļØ╝ņØś ņ¦ĆĻĖłņØ┤ Ēø©ņö¼ ļŹö ĒŖ╣ļ│äĒĢśņ¦Ć ņĢŖņĢśņØäĻ╣ī ņŗČļŗż. ĒæĖļģÉņØĆ ņŚ¼ĻĖ░ņä£ ņ×Āņŗ£ ņĀæņ¢┤ļæÉĻ│Ā ņśżļŖś ņåīĻ░£ĒĢĀ Ļ││ņØĆ, ļ╣äņŚöļéśņØś ņ×ÉņŚ░ņé¼ ļ░Ģļ¼╝Ļ┤ĆĻ│╝ ņØśĒÜī ĻĘĖļ”¼Ļ│Ā ņŗ£ņ▓ŁņØś ļ¬©ņŖĄņØ┤ļŗż.

 ņ¦Ćļé£ ĒżņŖżĒŖĖņŚÉņä£ ņåīĻ░£ĒĢ£ Hofburg ĻČüņĀäĻ│╝ ļö▒ ļ¦łņŻ╝ĒĢśĻ│Ā ņ׳ļŖö ņ×ÉņŚ░ņé¼ ļ░Ģļ¼╝Ļ┤Ć. ļ░Ģļ¼╝Ļ┤Ć ņĀĢņøÉņŚÉņä£ļÅä Hofburg ĻČüņĀäņØś Ļ╣āļ░£ņØä ļ│╝ ņłśĻ░Ć ņ׳ļŗż. ņśłņāüĒĢĀ ņłś ņ׳ļō»ņØ┤ ņØ┤ Ļ││ņØĆ ņä╝Ēä░ ņżæņØś ņä╝Ēä░, ļ╣äņŚöļéś ņŗ£ļé┤ņŚÉņä£ Ļ┤ĆĻ┤æĻ░ØļōżņØ┤ Ļ░Ćņן ļ¦ÄņØ┤ ņÖöļŗż Ļ░öļŗż ĒĢśļŖö ĻĖĖļ¬®ņŚÉ ņ£äņ╣śĒĢśĻ│Ā ņ׳ļŗżĻ│Ā ļ│┤ļ®┤ ļÉ£ļŗż. ņé¼ņŗż ņŖłĒģīĒīÉ ņä▒ļŗ╣, ņ×ÉņŚ░ņé¼ ļ░Ģļ¼╝Ļ┤Ć, Hofburg ĻČüņĀä,┬Ā ņØśĒÜī, ņŗ£ņ▓Ł ļō▒ņØś ņןņåīļōżņØĆ ļ¬©ļæÉ ļÅäļ│┤ļĪ£ 30ļČä ņØ┤ļé┤ņØś Ļ▒░ļ”¼ņŚÉ ņ£äņ╣ś ĒĢśĻ│Ā ņ׳ĻĖ░ ļĢīļ¼ĖņŚÉ ņ¦ĆļÅä ĒĢ£ ņן ļōżĻ│Ā Ļ▒Ėņ¢┤ņä£ ĻĄ¼ņäØĻĄ¼ņäØ ĻĄ¼Ļ▓ĮĒĢśļ®░, ļ░▒ļ░░ņ╗żņØś ņĀĢņ╣śļź╝ ļŖÉļü╝ĻĖ░ņŚÉ ņĢłņä▒ļ¦×ņČżņØ┤ļØ╝Ļ│Ā ĒĢĀ ņłś ņ׳Ļ▓Āļŗż.
ņ¦Ćļé£ ĒżņŖżĒŖĖņŚÉņä£ ņåīĻ░£ĒĢ£ Hofburg ĻČüņĀäĻ│╝ ļö▒ ļ¦łņŻ╝ĒĢśĻ│Ā ņ׳ļŖö ņ×ÉņŚ░ņé¼ ļ░Ģļ¼╝Ļ┤Ć. ļ░Ģļ¼╝Ļ┤Ć ņĀĢņøÉņŚÉņä£ļÅä Hofburg ĻČüņĀäņØś Ļ╣āļ░£ņØä ļ│╝ ņłśĻ░Ć ņ׳ļŗż. ņśłņāüĒĢĀ ņłś ņ׳ļō»ņØ┤ ņØ┤ Ļ││ņØĆ ņä╝Ēä░ ņżæņØś ņä╝Ēä░, ļ╣äņŚöļéś ņŗ£ļé┤ņŚÉņä£ Ļ┤ĆĻ┤æĻ░ØļōżņØ┤ Ļ░Ćņן ļ¦ÄņØ┤ ņÖöļŗż Ļ░öļŗż ĒĢśļŖö ĻĖĖļ¬®ņŚÉ ņ£äņ╣śĒĢśĻ│Ā ņ׳ļŗżĻ│Ā ļ│┤ļ®┤ ļÉ£ļŗż. ņé¼ņŗż ņŖłĒģīĒīÉ ņä▒ļŗ╣, ņ×ÉņŚ░ņé¼ ļ░Ģļ¼╝Ļ┤Ć, Hofburg ĻČüņĀä,┬Ā ņØśĒÜī, ņŗ£ņ▓Ł ļō▒ņØś ņןņåīļōżņØĆ ļ¬©ļæÉ ļÅäļ│┤ļĪ£ 30ļČä ņØ┤ļé┤ņØś Ļ▒░ļ”¼ņŚÉ ņ£äņ╣ś ĒĢśĻ│Ā ņ׳ĻĖ░ ļĢīļ¼ĖņŚÉ ņ¦ĆļÅä ĒĢ£ ņן ļōżĻ│Ā Ļ▒Ėņ¢┤ņä£ ĻĄ¼ņäØĻĄ¼ņäØ ĻĄ¼Ļ▓ĮĒĢśļ®░, ļ░▒ļ░░ņ╗żņØś ņĀĢņ╣śļź╝ ļŖÉļü╝ĻĖ░ņŚÉ ņĢłņä▒ļ¦×ņČżņØ┤ļØ╝Ļ│Ā ĒĢĀ ņłś ņ׳Ļ▓Āļŗż.


 ļ░Ģļ¼╝Ļ┤Ć ņĀĢņøÉņŚÉ ļōżņ¢┤ņä£ļ®┤ ņīŹļæźņØ┤ņ▓śļ¤╝ ļśæĻ░ÖņØ┤ ņāØĻĖ┤ ļæÉ Ļ▒┤ļ¼╝ņØ┤ ņä£ļĪ£ ļ¦łņŻ╝ ļ│┤ļ®░ ņä£ ņ׳ļŗż. ņĀĢņøÉ ņżæņĢÖņŚÉ ļåōņŚ¼ņ׳ļŖö ņĀĆ ļÅÖņāüņØĆ ņĀĆ ļ░Ģļ¼╝Ļ┤Ć ņĢłņŚÉļŖö ļ¼╝ļĪĀ ļŹö ĒØźļ»ĖļĪ£ņÜ┤ Ļ▓āļōżņØ┤ ļ¦ÄņØ┤ ņ׳Ļ▓Āņ¦Ćļ¦ī┬ĀņĀĢņøÉ ļ▓żņ╣śņŚÉ ņĢēņĢäņä£ Ļ▒┤ļ¼╝Ļ│╝ ņĀĢņøÉņØä Ļ░ÉņāüĒĢśļŖö Ļ▓āļ¦īņ£╝ļĪ£ļÅä ņØ┤ Ļ││ņØś ņĀĢņĘ©ļź╝ ĒØĀļ╗æ ļŖÉļéä ņłś ņ׳ļŗż. ņ┤Ø 8,700ĒÅēņØś ĻĘ£ļ¬©ļź╝ ņ×Éļ×æĒĢśļŖö ņØ┤ ļ░Ģļ¼╝Ļ┤ĆņØĆ ņäĖĻ│äņŚÉņä£ Ļ░Ćņן ņżæņÜöĒĢ£ ļ░Ģļ¼╝Ļ┤ĆļōżņŚÉ ļŗ╣ļŗ╣Ē׳ ĻĘĖ ņØ┤ļ”äņØä ļīĆļ░Ć ņĀĢļÅäļĪ£ ņ¢┤ļ¦łņ¢┤ļ¦łĒĢ£ ņĀäņŗ£ ĻĘ£ļ¬©ļź╝ ņ×Éļ×æĒĢ£ļŗż. ņØ┤ļ▓łņŚÉļŖö ļ╣äļĪØ ļ░Ģļ¼╝Ļ┤Ć ļé┤ļČĆņØś ņĀäņŗ£ĒÆłļōżņØĆ Ļ┤Ćļ×īĒĢśņ¦Ć ņĢŖņĢśņ¦Ćļ¦ī, Ļ╝Ł ĒĢ£ļ▓ł Ļ▓¼ĒĢÖĒĢśĻ▓ĀļŗżĻ│Ā ļ¦łņØīņØä ļ©╣ņŚłļŗż. ĒÖłĒÄśņØ┤ņ¦Ćļź╝ ļ░®ļ¼ĖĒĢśļ®┤ ļŹö ļ¦ÄņØĆ ņĀĢļ│┤ļź╝ ļ│╝ ņłś ņ׳ļŗż.
ļ░Ģļ¼╝Ļ┤Ć ņĀĢņøÉņŚÉ ļōżņ¢┤ņä£ļ®┤ ņīŹļæźņØ┤ņ▓śļ¤╝ ļśæĻ░ÖņØ┤ ņāØĻĖ┤ ļæÉ Ļ▒┤ļ¼╝ņØ┤ ņä£ļĪ£ ļ¦łņŻ╝ ļ│┤ļ®░ ņä£ ņ׳ļŗż. ņĀĢņøÉ ņżæņĢÖņŚÉ ļåōņŚ¼ņ׳ļŖö ņĀĆ ļÅÖņāüņØĆ ņĀĆ ļ░Ģļ¼╝Ļ┤Ć ņĢłņŚÉļŖö ļ¼╝ļĪĀ ļŹö ĒØźļ»ĖļĪ£ņÜ┤ Ļ▓āļōżņØ┤ ļ¦ÄņØ┤ ņ׳Ļ▓Āņ¦Ćļ¦ī┬ĀņĀĢņøÉ ļ▓żņ╣śņŚÉ ņĢēņĢäņä£ Ļ▒┤ļ¼╝Ļ│╝ ņĀĢņøÉņØä Ļ░ÉņāüĒĢśļŖö Ļ▓āļ¦īņ£╝ļĪ£ļÅä ņØ┤ Ļ││ņØś ņĀĢņĘ©ļź╝ ĒØĀļ╗æ ļŖÉļéä ņłś ņ׳ļŗż. ņ┤Ø 8,700ĒÅēņØś ĻĘ£ļ¬©ļź╝ ņ×Éļ×æĒĢśļŖö ņØ┤ ļ░Ģļ¼╝Ļ┤ĆņØĆ ņäĖĻ│äņŚÉņä£ Ļ░Ćņן ņżæņÜöĒĢ£ ļ░Ģļ¼╝Ļ┤ĆļōżņŚÉ ļŗ╣ļŗ╣Ē׳ ĻĘĖ ņØ┤ļ”äņØä ļīĆļ░Ć ņĀĢļÅäļĪ£ ņ¢┤ļ¦łņ¢┤ļ¦łĒĢ£ ņĀäņŗ£ ĻĘ£ļ¬©ļź╝ ņ×Éļ×æĒĢ£ļŗż. ņØ┤ļ▓łņŚÉļŖö ļ╣äļĪØ ļ░Ģļ¼╝Ļ┤Ć ļé┤ļČĆņØś ņĀäņŗ£ĒÆłļōżņØĆ Ļ┤Ćļ×īĒĢśņ¦Ć ņĢŖņĢśņ¦Ćļ¦ī, Ļ╝Ł ĒĢ£ļ▓ł Ļ▓¼ĒĢÖĒĢśĻ▓ĀļŗżĻ│Ā ļ¦łņØīņØä ļ©╣ņŚłļŗż. ĒÖłĒÄśņØ┤ņ¦Ćļź╝ ļ░®ļ¼ĖĒĢśļ®┤ ļŹö ļ¦ÄņØĆ ņĀĢļ│┤ļź╝ ļ│╝ ņłś ņ׳ļŗż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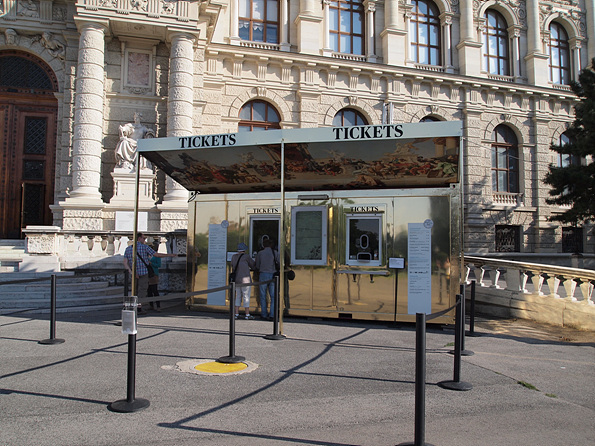

 ņä▒ņØĖ ņØ╝ļ░ś ņÜöĻĖłņØĆ 14ņ£ĀļĪ£. ņŚ¼ļŖÉ ņśłņłĀ ļ░Ģļ¼╝Ļ┤ĆĻ│╝ ļ╣äĻĄÉĒĢ┤ļ┤ÉļÅä ņ¦Ćļéśņ╣śĻ▓ī ļ╣äņŗĖņ¦Ć ņĢŖņØĆ ņĀüļŗ╣ĒĢ£ ņÜöĻĖł Ļ░Öļŗż. ĒĢÖņāØ, ļŗ©ņ▓┤ ļō▒ņØś ĒĢĀņØĖņØ┤ Ļ░ĆļŖźĒĢśņ¦Ćļ¦ī, ņØ╝ļ░ś Ļ┤ĆĻ┤æĻ░ØļōżņŚÉĻ▓īļŖö ĒĢ┤ļŗ╣ņé¼ĒĢŁņØ┤ ņŚåņ£╝ļ»ĆļĪ£ ĻĘĖļāź 14ņ£ĀļĪ£ļØ╝Ļ│Ā ņāØĻ░üĒĢśņ×É. ļé┤Ļ░Ć Ļ░ä ļéĀņØ┤ ļéĀņö©Ļ░Ć ņóŗņĢäņä£ ĻĘĖļ¤░ņ¦Ć ļ░Ģļ¼╝Ļ┤Ć Ļ▓Įņ╣śĻ░Ć ļŹö ņóŗņĢä ļ│┤ņØĖļŗż. ņל ņĀĢļÅł ļÉ£ ņĀĢņøÉņłśļōż, ņ×ÉĻĘĖļ¦łĒĢ£ ļČäņłśļīĆ,┬ĀņĀĢņøÉ ņżæņĢÖņŚÉ ļåōņØĖ ļÅÖņāüĻ╣īņ¦Ć ņ¢┤ļŖÉ ĒĢśļéś Ē¢ćļ╣ø ņĢäļל ņĢäļ”äļŗżņøī ļ│┤ņØ┤ņ¦Ć┬ĀņĢŖļŖö Ļ▓āņØ┤ ņŚåņŚłļŗż. ĻĘĖļ¤░ļŹ░┬Āļö▒ ĒĢśļéś Ļ▒░ņŖ¼ļĀĖļŹś┬ĀņĀÉ. ņĀĢņøÉņłś ņåŹņŚÉ ļōżņ¢┤Ļ░Ćņä£ ļéśļ¼┤ļź╝ ĒØöļōżņ¢┤ ņ×¼ļü╝ļ®░ Ļ▓Įņ╣śļź╝ Ēø╝ņåÉĒĢśĻ│Ā ņ׳ļŹś Ļ░£ļģÉņŚåļŖö Ļ╝¼ļ¦ł ņĢäņØ┤.┬ĀņÜ░ļ”¼ ļéśļØ╝ Ļ░Öņ£╝ļ®┤ ĒלļōżņŚ¼ Ļ┤Ćļ”¼ĒĢ£ ņØ┤ ņĀĢņøÉņØä ņé¼ļ×īļōżņØ┤┬ĀņĢēņĢä ņē¼Ļ│Ā ņØ╝Ļ┤æņÜĢĒĢśļŖö Ļ│ĄĻ░äņ£╝ļĪ£ ņśżĒöłĒĢśņ¦Ć ņĢŖĻ▓Āņ¦Ćļ¦ī, ņØ┤ Ļ││ ļ╣äņŚöļéśņŚÉņäĀ ņé¼ļ×īļōżņØ┤ ņĢēņĢä ņē┤ ņłś ņ׳Ļ▓ī┬Āņןņåīļź╝ ņśżĒöł ĒĢ┤ ļåōņĢśļŗż. ĻĘĖļ¤╝ Ļ│ĄņżæļÅäļŹĢņØä ņ¦ĆĒéżĻ│Ā ļé©ļōżņŚÉĻ▓ī Ēö╝ĒĢ┤ļź╝ ņŻ╝ņ¦Ć ņĢŖĻ▓ī ņל ņ”ÉĻĖ░ļ®┤ ļÉśļŖöļŹ░,┬Ā ņ¢┤ļö£Ļ░Ćļéś Ļ╝Ł ņØ┤ļĀćĻ▓ī ļ»╝ĒÅÉ ļČĆļ”¼ļŖö┬Āņé¼ļ×īļōżņØ┤ ņ׳ļŗż. Ļ░ĆņĪ▒ ļŗ©ņ£äļĪ£ ļåĆļ¤¼ļéśņś© ņé¼ļ×īļōż Ļ░ÖņĢśļŖöļŹ░ (Ļ┤ĆĻ┤æĻ░Øņ▓śļ¤╝ ļ│┤ņØ┤ņ¦ä ņĢŖņĢśļŗż.) ņŚäļ¦łļÅä ņĢäļ╣ĀļÅä ņĢäļ¼┤ļÅä ņĢäņØ┤ļź╝ ĻŠĖņ¦¢ņ¦Ć ņĢŖĻ│Ā ņלļ¬╗ņØä ņĀĢņĀĢĒĢ┤ņŻ╝ņ¦ĆļÅä┬ĀņĢŖņĢśļŗż. ņ¢┤ņ░ī Ēü┤ņ¦Ć, ņ░Ė ņĢłļ┤ÉļÅä ļ╗öĒĢśļŗż. ┬Ā┬Ā┬Ā
ņä▒ņØĖ ņØ╝ļ░ś ņÜöĻĖłņØĆ 14ņ£ĀļĪ£. ņŚ¼ļŖÉ ņśłņłĀ ļ░Ģļ¼╝Ļ┤ĆĻ│╝ ļ╣äĻĄÉĒĢ┤ļ┤ÉļÅä ņ¦Ćļéśņ╣śĻ▓ī ļ╣äņŗĖņ¦Ć ņĢŖņØĆ ņĀüļŗ╣ĒĢ£ ņÜöĻĖł Ļ░Öļŗż. ĒĢÖņāØ, ļŗ©ņ▓┤ ļō▒ņØś ĒĢĀņØĖņØ┤ Ļ░ĆļŖźĒĢśņ¦Ćļ¦ī, ņØ╝ļ░ś Ļ┤ĆĻ┤æĻ░ØļōżņŚÉĻ▓īļŖö ĒĢ┤ļŗ╣ņé¼ĒĢŁņØ┤ ņŚåņ£╝ļ»ĆļĪ£ ĻĘĖļāź 14ņ£ĀļĪ£ļØ╝Ļ│Ā ņāØĻ░üĒĢśņ×É. ļé┤Ļ░Ć Ļ░ä ļéĀņØ┤ ļéĀņö©Ļ░Ć ņóŗņĢäņä£ ĻĘĖļ¤░ņ¦Ć ļ░Ģļ¼╝Ļ┤Ć Ļ▓Įņ╣śĻ░Ć ļŹö ņóŗņĢä ļ│┤ņØĖļŗż. ņל ņĀĢļÅł ļÉ£ ņĀĢņøÉņłśļōż, ņ×ÉĻĘĖļ¦łĒĢ£ ļČäņłśļīĆ,┬ĀņĀĢņøÉ ņżæņĢÖņŚÉ ļåōņØĖ ļÅÖņāüĻ╣īņ¦Ć ņ¢┤ļŖÉ ĒĢśļéś Ē¢ćļ╣ø ņĢäļל ņĢäļ”äļŗżņøī ļ│┤ņØ┤ņ¦Ć┬ĀņĢŖļŖö Ļ▓āņØ┤ ņŚåņŚłļŗż. ĻĘĖļ¤░ļŹ░┬Āļö▒ ĒĢśļéś Ļ▒░ņŖ¼ļĀĖļŹś┬ĀņĀÉ. ņĀĢņøÉņłś ņåŹņŚÉ ļōżņ¢┤Ļ░Ćņä£ ļéśļ¼┤ļź╝ ĒØöļōżņ¢┤ ņ×¼ļü╝ļ®░ Ļ▓Įņ╣śļź╝ Ēø╝ņåÉĒĢśĻ│Ā ņ׳ļŹś Ļ░£ļģÉņŚåļŖö Ļ╝¼ļ¦ł ņĢäņØ┤.┬ĀņÜ░ļ”¼ ļéśļØ╝ Ļ░Öņ£╝ļ®┤ ĒלļōżņŚ¼ Ļ┤Ćļ”¼ĒĢ£ ņØ┤ ņĀĢņøÉņØä ņé¼ļ×īļōżņØ┤┬ĀņĢēņĢä ņē¼Ļ│Ā ņØ╝Ļ┤æņÜĢĒĢśļŖö Ļ│ĄĻ░äņ£╝ļĪ£ ņśżĒöłĒĢśņ¦Ć ņĢŖĻ▓Āņ¦Ćļ¦ī, ņØ┤ Ļ││ ļ╣äņŚöļéśņŚÉņäĀ ņé¼ļ×īļōżņØ┤ ņĢēņĢä ņē┤ ņłś ņ׳Ļ▓ī┬Āņןņåīļź╝ ņśżĒöł ĒĢ┤ ļåōņĢśļŗż. ĻĘĖļ¤╝ Ļ│ĄņżæļÅäļŹĢņØä ņ¦ĆĒéżĻ│Ā ļé©ļōżņŚÉĻ▓ī Ēö╝ĒĢ┤ļź╝ ņŻ╝ņ¦Ć ņĢŖĻ▓ī ņל ņ”ÉĻĖ░ļ®┤ ļÉśļŖöļŹ░,┬Ā ņ¢┤ļö£Ļ░Ćļéś Ļ╝Ł ņØ┤ļĀćĻ▓ī ļ»╝ĒÅÉ ļČĆļ”¼ļŖö┬Āņé¼ļ×īļōżņØ┤ ņ׳ļŗż. Ļ░ĆņĪ▒ ļŗ©ņ£äļĪ£ ļåĆļ¤¼ļéśņś© ņé¼ļ×īļōż Ļ░ÖņĢśļŖöļŹ░ (Ļ┤ĆĻ┤æĻ░Øņ▓śļ¤╝ ļ│┤ņØ┤ņ¦ä ņĢŖņĢśļŗż.) ņŚäļ¦łļÅä ņĢäļ╣ĀļÅä ņĢäļ¼┤ļÅä ņĢäņØ┤ļź╝ ĻŠĖņ¦¢ņ¦Ć ņĢŖĻ│Ā ņלļ¬╗ņØä ņĀĢņĀĢĒĢ┤ņŻ╝ņ¦ĆļÅä┬ĀņĢŖņĢśļŗż. ņ¢┤ņ░ī Ēü┤ņ¦Ć, ņ░Ė ņĢłļ┤ÉļÅä ļ╗öĒĢśļŗż. ┬Ā┬Ā┬Ā

 ņ×ÉņŚ░ņé¼ ļ░Ģļ¼╝Ļ┤ĆņŚÉņä£ ĒĢ£ Ēģ£Ēż ņē¼ņŚłļŗżĻ░Ć ņŗ£ņ▓Ł ņ¬Įņ£╝ļĪ£ ļŗżņŗ£ ļ░£Ļ▒ĖņØīņØä ņś«Ļ▓╝ļŗż. ņ×ÉņŚ░ņé¼ ļ░Ģļ¼╝Ļ┤ĆĻ│╝ ņŗ£ņ▓Ł ņé¼ņØ┤ņŚÉļŖö ņśżņŖżĒŖĖļ”¼ņĢä┬ĀņØśĒÜīĻ░Ć ņ£äņ╣śĒĢśĻ│Ā ņ׳ļŗż. ņÜ░ļ”¼ ļéśļØ╝ ĻĄŁĒÜī ņØśņé¼ļŗ╣ ļ│┤ļŗżļÅä┬ĀņśżĒ׳ļĀż ļŹö ņåīļ░ĢĒĢ£ ĻĘ£ļ¬©ņØĖ Ļ▓ā Ļ░Öļŗż. ņś¼ ļĢīļ¦łļŗż ļ│┤ņłś Ļ│Ąņé¼ļĪ£ Ļ╣©ļüŚĒĢ£ ĒÆĆ ņāĘņØä ņ░Źņ¦Ć ļ¬╗ Ē¢łņŚłļŖöļŹ░ ļō£ļööņ¢┤ ņé¼ņ¦ä ņ░ŹĻĖ░ņŚÉ ņä▒Ļ│Ą. ņŚŁņŗ£ļéś ņģöĒä░ļź╝ ļČĆļź┤ļŖö ņĢäļ”äļŗżņÜ┤ ņ×ÉĒā£ļŗż. ņĀĆļģüļ¼┤ļĀĄņØ┤ ļÉśņ¢┤ņä£ ĻĘĖļ¤░ņ¦Ć Ļ┤ĆĻ┤æĻ░ØļōżņØ┤ ĻĘĖļĀćĻ▓ī ļ¦Äņ¦ĆļŖö ņĢŖņĢśļŗż. ĒĢśņ¦Ćļ¦ī ņŚ¼ļ”ä ļé┤ļé┤ Ļ┤ĆĻ┤æĻ░ØļōżļĪ£ ņŚäņ▓Ł ļČüņĀüĻ▒░ļ”¼ļŖö Ļ┤ĆĻ┤æ ĒżņØĖĒŖĖ ņżæņØś ĒĢśļéśņØ┤ļŗż.
ņ×ÉņŚ░ņé¼ ļ░Ģļ¼╝Ļ┤ĆņŚÉņä£ ĒĢ£ Ēģ£Ēż ņē¼ņŚłļŗżĻ░Ć ņŗ£ņ▓Ł ņ¬Įņ£╝ļĪ£ ļŗżņŗ£ ļ░£Ļ▒ĖņØīņØä ņś«Ļ▓╝ļŗż. ņ×ÉņŚ░ņé¼ ļ░Ģļ¼╝Ļ┤ĆĻ│╝ ņŗ£ņ▓Ł ņé¼ņØ┤ņŚÉļŖö ņśżņŖżĒŖĖļ”¼ņĢä┬ĀņØśĒÜīĻ░Ć ņ£äņ╣śĒĢśĻ│Ā ņ׳ļŗż. ņÜ░ļ”¼ ļéśļØ╝ ĻĄŁĒÜī ņØśņé¼ļŗ╣ ļ│┤ļŗżļÅä┬ĀņśżĒ׳ļĀż ļŹö ņåīļ░ĢĒĢ£ ĻĘ£ļ¬©ņØĖ Ļ▓ā Ļ░Öļŗż. ņś¼ ļĢīļ¦łļŗż ļ│┤ņłś Ļ│Ąņé¼ļĪ£ Ļ╣©ļüŚĒĢ£ ĒÆĆ ņāĘņØä ņ░Źņ¦Ć ļ¬╗ Ē¢łņŚłļŖöļŹ░ ļō£ļööņ¢┤ ņé¼ņ¦ä ņ░ŹĻĖ░ņŚÉ ņä▒Ļ│Ą. ņŚŁņŗ£ļéś ņģöĒä░ļź╝ ļČĆļź┤ļŖö ņĢäļ”äļŗżņÜ┤ ņ×ÉĒā£ļŗż. ņĀĆļģüļ¼┤ļĀĄņØ┤ ļÉśņ¢┤ņä£ ĻĘĖļ¤░ņ¦Ć Ļ┤ĆĻ┤æĻ░ØļōżņØ┤ ĻĘĖļĀćĻ▓ī ļ¦Äņ¦ĆļŖö ņĢŖņĢśļŗż. ĒĢśņ¦Ćļ¦ī ņŚ¼ļ”ä ļé┤ļé┤ Ļ┤ĆĻ┤æĻ░ØļōżļĪ£ ņŚäņ▓Ł ļČüņĀüĻ▒░ļ”¼ļŖö Ļ┤ĆĻ┤æ ĒżņØĖĒŖĖ ņżæņØś ĒĢśļéśņØ┤ļŗż.


 ņØśĒÜīņŚÉņä£ ņĪ░ĻĖłļ¦ī ļŹö Ļ▒Ėņ¢┤ņä£ ņś¼ļØ╝Ļ░Ćļ®┤ ļ░öļĪ£ ņŗ£ņ▓ŁņØ┤ļŗż. 9ņøö 1ņØ╝Ļ╣īņ¦Ć ņŗ£ņ▓Ł ņĢ×ņØä ņĀÉļĀ╣ĒĢśĻ│Ā ņ׳ņØä ĒĢäļ”ä ĒÄśņŖżĒŗ░ļ▓īņØś ĒØöņĀüļōż. Ļ│¦ ļüØņØ┤ļéśĻ▓ĀĻĄ¼ļéś. ņŚ¼ļ”ä ļ░żņØä ļ£©Ļ▓üĻ▓ī ļŗ¼ĻĄ¼ņ¢┤ ņŻ╝ņŚłļŹś ņØ┤ ĒĢäļ”ä ĒÄśņŖżĒŗ░ļ▓īņØ┤ ļüØļéśļ®┤ ļŁöĻ░Ć ņŚ¼ļ”äļ¦łņĀĆ ņÖäņĀäĒ׳ ļüØļé£ Ļ▓ā Ļ░ÖņØĆ ļŖÉļéīņØ┤ ļōż Ļ▓ā Ļ░Öļŗż. ĻĘĖļ”¼Ļ│Ā ņ╣£ĻĄ¼ļōżĻ│╝ ņØ┤ņĢ╝ĻĖ░ ĒĢśļŗżĻ░Ć ņÜ░ņŚ░Ē׳ ņĢīĻ▓ī ļÉ£ Ļ▒┤ļŹ░, ņØ┤ Ļ││ņØś ņŗ£ņ▓ŁņØĆ ņÜ░ļ”¼ ļéśļØ╝ņØś ņŗ£ņ▓Łņ▓śļ¤╝ Ē¢ēņĀĢ ņŚģļ¼┤ļź╝ ĒĢ┤ņŻ╝ļŖö Ļ││ņØ┤ ņĢäļŗłļØ╝ ņŗ£ņןņØ┤ ĻĘ╝ļ¼┤ĒĢśļŖö Ļ││ņØ┤ņ×É ņŗ£ņ▓ŁņØ┤ļØ╝ļŖö ņāüņ¦ĢņĀüņØĖ ņןņåīņØ╝ ļ┐ÉņØ┤ļ×Ćļŗż. Ē¢ēņĀĢņŚģļ¼┤ļź╝ ļ│┤ļŖö Ļ││ņØĆ ļö░ļĪ£ ņ׳ļŗżĻ│Ā ĒĢśļŖöļŹ░, ļŁöĻ░Ć ļé┤Ļ░Ć ņāØĻ░üĒĢśļŹś ņŗ£ņ▓ŁņØś ļŖÉļéīņØ┤ ņĢäļŗłļØ╝ņä£ Ļ░æņ×ÉĻĖ░ ņóĆ ņāØņåīĒ¢łļŗż. ņŗ£ļ»╝ļōżņØ┤ ņ¦üņĀæ ļōżņ¢┤Ļ░Ćņä£ ĒĢäņÜöĒĢ£ Ļ▓āņØä ĒĢ┤Ļ▓░ĒĢśļŖö Ļ││ņØ┤ ņŗ£ņ▓ŁņØ┤ņ¦Ć. ĻĘĖļלļÅä ņØ┤ļ¤░ Ē¢ēņé¼ļōżņØ┤ ņ▓Āļ¦łļŗż ņŚ┤ļ”¼ļŖö Ļ▓āņØä┬Āļ│┤ļŗł ļéśļ”äņØś Ļ░£ļģÉņ£╝ļĪ£┬Āņŗ£ļ»╝ļōżĻ│╝ ĒĢ©Ļ╗ś ņł©ņē¼ļŖö Ļ│ĄĻ░äņØĖ Ļ▓āļ¦īņØĆ ĒÖĢņŗżĒĢśļŗż.┬Ā
ņØśĒÜīņŚÉņä£ ņĪ░ĻĖłļ¦ī ļŹö Ļ▒Ėņ¢┤ņä£ ņś¼ļØ╝Ļ░Ćļ®┤ ļ░öļĪ£ ņŗ£ņ▓ŁņØ┤ļŗż. 9ņøö 1ņØ╝Ļ╣īņ¦Ć ņŗ£ņ▓Ł ņĢ×ņØä ņĀÉļĀ╣ĒĢśĻ│Ā ņ׳ņØä ĒĢäļ”ä ĒÄśņŖżĒŗ░ļ▓īņØś ĒØöņĀüļōż. Ļ│¦ ļüØņØ┤ļéśĻ▓ĀĻĄ¼ļéś. ņŚ¼ļ”ä ļ░żņØä ļ£©Ļ▓üĻ▓ī ļŗ¼ĻĄ¼ņ¢┤ ņŻ╝ņŚłļŹś ņØ┤ ĒĢäļ”ä ĒÄśņŖżĒŗ░ļ▓īņØ┤ ļüØļéśļ®┤ ļŁöĻ░Ć ņŚ¼ļ”äļ¦łņĀĆ ņÖäņĀäĒ׳ ļüØļé£ Ļ▓ā Ļ░ÖņØĆ ļŖÉļéīņØ┤ ļōż Ļ▓ā Ļ░Öļŗż. ĻĘĖļ”¼Ļ│Ā ņ╣£ĻĄ¼ļōżĻ│╝ ņØ┤ņĢ╝ĻĖ░ ĒĢśļŗżĻ░Ć ņÜ░ņŚ░Ē׳ ņĢīĻ▓ī ļÉ£ Ļ▒┤ļŹ░, ņØ┤ Ļ││ņØś ņŗ£ņ▓ŁņØĆ ņÜ░ļ”¼ ļéśļØ╝ņØś ņŗ£ņ▓Łņ▓śļ¤╝ Ē¢ēņĀĢ ņŚģļ¼┤ļź╝ ĒĢ┤ņŻ╝ļŖö Ļ││ņØ┤ ņĢäļŗłļØ╝ ņŗ£ņןņØ┤ ĻĘ╝ļ¼┤ĒĢśļŖö Ļ││ņØ┤ņ×É ņŗ£ņ▓ŁņØ┤ļØ╝ļŖö ņāüņ¦ĢņĀüņØĖ ņןņåīņØ╝ ļ┐ÉņØ┤ļ×Ćļŗż. Ē¢ēņĀĢņŚģļ¼┤ļź╝ ļ│┤ļŖö Ļ││ņØĆ ļö░ļĪ£ ņ׳ļŗżĻ│Ā ĒĢśļŖöļŹ░, ļŁöĻ░Ć ļé┤Ļ░Ć ņāØĻ░üĒĢśļŹś ņŗ£ņ▓ŁņØś ļŖÉļéīņØ┤ ņĢäļŗłļØ╝ņä£ Ļ░æņ×ÉĻĖ░ ņóĆ ņāØņåīĒ¢łļŗż. ņŗ£ļ»╝ļōżņØ┤ ņ¦üņĀæ ļōżņ¢┤Ļ░Ćņä£ ĒĢäņÜöĒĢ£ Ļ▓āņØä ĒĢ┤Ļ▓░ĒĢśļŖö Ļ││ņØ┤ ņŗ£ņ▓ŁņØ┤ņ¦Ć. ĻĘĖļלļÅä ņØ┤ļ¤░ Ē¢ēņé¼ļōżņØ┤ ņ▓Āļ¦łļŗż ņŚ┤ļ”¼ļŖö Ļ▓āņØä┬Āļ│┤ļŗł ļéśļ”äņØś Ļ░£ļģÉņ£╝ļĪ£┬Āņŗ£ļ»╝ļōżĻ│╝ ĒĢ©Ļ╗ś ņł©ņē¼ļŖö Ļ│ĄĻ░äņØĖ Ļ▓āļ¦īņØĆ ĒÖĢņŗżĒĢśļŗż.┬Ā
 ļŹżņ£╝ļĪ£ ņØ┤ Ļ││ņØĆ ļé┤Ļ░Ć ņ¢┤ĒĢÖ ņłśņŚģņØä ļōŻĻ│Ā ņ׳ļŖö ļ╣äņŚöļéś ļīĆĒĢÖņØś ļ│ĖņøÉ Ļ▒┤ļ¼╝. ļ╣äņŚöļéś ļīĆĒĢÖņØĆ ļ»ĖĻĄŁ ļīĆĒĢÖļōżņØ┤ļéś ņÜ░ļ”¼ļéśļØ╝ ļīĆĒĢÖļōżņ▓śļ¤╝ ĒĢśļéśņØś ņ║ĀĒŹ╝ņŖżņŚÉ ļ¬©ļōĀ Ļ▓āņØ┤ ļ¬©ņŚ¼ņ׳ņ¦Ć ņĢŖļŗż. ļÅäņŗ£ Ļ││Ļ││ņŚÉ ļ▓ĢļīĆ, ņĢĮļīĆ, Ļ│ĄļīĆ ļō▒ļō▒ņØś ņ║ĀĒŹ╝ņŖżļōżņØ┤ ļö░ļĪ£ ļéśļēśņ¢┤ņĀĖ ņ׳ļŗżĻ│Ā ĒĢ£ļŗż. ņØ┤ Ļ││ņŚÉņäĀ ņłśņŚģņØ┤ ņØ┤ļŻ©ņ¢┤ņ¦ĆĻĖ░ļÅä ĒĢśņ¦Ćļ¦ī ĒĢÖņé¼ Ļ┤ĆļĀ© Ē¢ēņĀĢņŚģļ¼┤ļź╝ ļ│╝ ņłś ņ׳ļŖö ņé¼ļ¼┤ņŗżņØ┤ ņ׳ĻĖ░ļĢīļ¼ĖņŚÉ ļō▒ļĪØ ļō▒ņØś Ē¢ēņĀĢ ņŚģļ¼┤Ļ░Ć ĒĢäņÜöĒĢĀ ļĢīļŖö ņØ┤ Ļ││ņØä ņ░ŠļŖöļŗż. ņŚ¼ĻĖ░Ļ╣īņ¦ĆĻ░Ć ņśżļŖś ņåīĻ░£ĒĢĀ ļ╣äņŚöļéśņØś ĒÆŹĻ▓ĮļōżņØ┤ļŗż. ņ¦Ćļé£ 6Ļ░£ņøö ļÅÖņĢł ļ│ä ņāØĻ░ü ņŚåņØ┤ ņ¦ĆļāłņŚłļŖöļŹ░ ņāłņé╝, ņ░Ė ļé┤Ļ░Ć ņóŗņØĆ ļÅäņŗ£ņŚÉ ņé┤Ļ│Ā ņ׳ņŚłĻĄ¼ļéś ĒĢśļŖö ņāØĻ░üņØ┤ ļōĀļŗż. ņÜ░ļ”¼ņÖĆļŖö ļ¦ÄņØ┤ ļŗżļźĖ ļ¬©ņŖĄņØ╝ņ¦Ć ļ¬©ļź┤Ļ▓Āņ¦Ćļ¦ī ĻĘĖļōżļ¦īņØś ņ¦łņä£ņÖĆ ĻĘĖļōżļ¦īņØś ļ¦żļĀźņØ┤ ņ׳ļŖö Ļ▓ā Ļ░Öļŗż. ņĢäļ”äļŗżņÜ┤ ļÅäņŗ£, ļ╣äņŚöļéś. ņóŗĻĄ¼ļéś.
ļŹżņ£╝ļĪ£ ņØ┤ Ļ││ņØĆ ļé┤Ļ░Ć ņ¢┤ĒĢÖ ņłśņŚģņØä ļōŻĻ│Ā ņ׳ļŖö ļ╣äņŚöļéś ļīĆĒĢÖņØś ļ│ĖņøÉ Ļ▒┤ļ¼╝. ļ╣äņŚöļéś ļīĆĒĢÖņØĆ ļ»ĖĻĄŁ ļīĆĒĢÖļōżņØ┤ļéś ņÜ░ļ”¼ļéśļØ╝ ļīĆĒĢÖļōżņ▓śļ¤╝ ĒĢśļéśņØś ņ║ĀĒŹ╝ņŖżņŚÉ ļ¬©ļōĀ Ļ▓āņØ┤ ļ¬©ņŚ¼ņ׳ņ¦Ć ņĢŖļŗż. ļÅäņŗ£ Ļ││Ļ││ņŚÉ ļ▓ĢļīĆ, ņĢĮļīĆ, Ļ│ĄļīĆ ļō▒ļō▒ņØś ņ║ĀĒŹ╝ņŖżļōżņØ┤ ļö░ļĪ£ ļéśļēśņ¢┤ņĀĖ ņ׳ļŗżĻ│Ā ĒĢ£ļŗż. ņØ┤ Ļ││ņŚÉņäĀ ņłśņŚģņØ┤ ņØ┤ļŻ©ņ¢┤ņ¦ĆĻĖ░ļÅä ĒĢśņ¦Ćļ¦ī ĒĢÖņé¼ Ļ┤ĆļĀ© Ē¢ēņĀĢņŚģļ¼┤ļź╝ ļ│╝ ņłś ņ׳ļŖö ņé¼ļ¼┤ņŗżņØ┤ ņ׳ĻĖ░ļĢīļ¼ĖņŚÉ ļō▒ļĪØ ļō▒ņØś Ē¢ēņĀĢ ņŚģļ¼┤Ļ░Ć ĒĢäņÜöĒĢĀ ļĢīļŖö ņØ┤ Ļ││ņØä ņ░ŠļŖöļŗż. ņŚ¼ĻĖ░Ļ╣īņ¦ĆĻ░Ć ņśżļŖś ņåīĻ░£ĒĢĀ ļ╣äņŚöļéśņØś ĒÆŹĻ▓ĮļōżņØ┤ļŗż. ņ¦Ćļé£ 6Ļ░£ņøö ļÅÖņĢł ļ│ä ņāØĻ░ü ņŚåņØ┤ ņ¦ĆļāłņŚłļŖöļŹ░ ņāłņé╝, ņ░Ė ļé┤Ļ░Ć ņóŗņØĆ ļÅäņŗ£ņŚÉ ņé┤Ļ│Ā ņ׳ņŚłĻĄ¼ļéś ĒĢśļŖö ņāØĻ░üņØ┤ ļōĀļŗż. ņÜ░ļ”¼ņÖĆļŖö ļ¦ÄņØ┤ ļŗżļźĖ ļ¬©ņŖĄņØ╝ņ¦Ć ļ¬©ļź┤Ļ▓Āņ¦Ćļ¦ī ĻĘĖļōżļ¦īņØś ņ¦łņä£ņÖĆ ĻĘĖļōżļ¦īņØś ļ¦żļĀźņØ┤ ņ׳ļŖö Ļ▓ā Ļ░Öļŗż. ņĢäļ”äļŗżņÜ┤ ļÅäņŗ£, ļ╣äņŚöļéś. ņóŗĻĄ¼ļéś.



Leave a Reply
Want to join the discussion?Feel free to contribute!